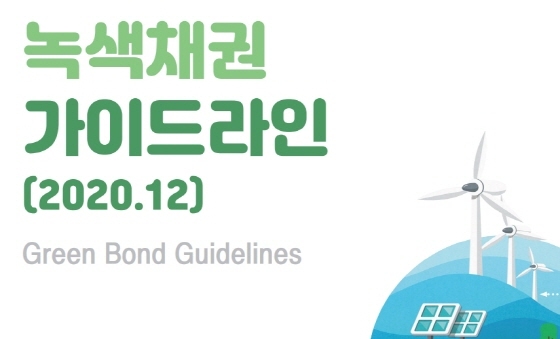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은행권들이 발행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이 무늬만 갖춘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정부는 ESG채권 중 녹색금융채권만 인정하고 있다. 제대로 된 규제와 감시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워싱’ 일명 ‘채권 세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현재 금융업계에서 ESG채권이라는 이름을 달고 발행되고 있는 채권들은 총 3종류다. 녹색금융채권(그린본드, E), 사회적채권(소셜본드, S), 지속가능채권(G)이다. 은행들에 따르면 이는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중소기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사회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대출 자원으로 사용된다.
이 가운데 관할 정부 부처나 분류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은 녹색금융채권뿐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와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공동 제정했다. 그린워싱 채권(실제로 환경 개선 효과가 없으나 녹색 채권으로 분류되는 채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조달자금의 사용▲프로젝트 평가와 선정과정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라는 의무사항들을 충족시켜야 ‘녹색금융채권’으로 유효성이 성립된다.
문제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사회적채권과 지속가능채권에는 없어서 일반 채권도 충분히 사회적채권·지속가능채권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 채권들의 ‘채권 세탁’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론 ESG와 관련이 없지만 ESG채권으로 둔갑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정부기관에서 인증한 것이지만 지속가능채권이나 사회적채권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충분히 일반 채권을 발행하고 나서 사회적 채권이나 지속가능채권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어서 은행입장에서도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즉 채권세탁에 취약하다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채권이나 지속가능채권은 워싱을 막을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며 “일반채권도 사회적·지속가능 채권으로 발행됟 수 있기 때문에 이 채권들을 발행했다는 통계가 ESG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ESG는 엄밀히 따지면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서 만든 것이 ESG인데 혼동해서 사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향후 정례적인 ESG채권 발행을 늘리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채권 세탁’ 위험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4368.gif)
![[NSP7컷]인터넷은행의 혁신적인 배신 [NSP7컷]인터넷은행의 혁신적인 배신](https://file.nspna.com/news/2023/05/30/photo_20230530123951_639759_0.jpg)
![[NSP PHOTO][업앤다운]게임주 상승…모비릭스↑·스타코링크↓](https://file.nspna.com/news/2025/04/03/20250403182808_748364_0.jpg)
![[NSP PHOTO][유통·식품 업계동향]쿠팡VS이커머스 승자는 대한통운…웃다 우는 삼양식품 관세 부메랑](https://file.nspna.com/news/2025/04/03/20250403175730_748355_0.jpg)
![[NSP PHOTO]금융당국 수장들, 지분형 모기지 전환 한목소리](https://file.nspna.com/news/2025/04/03/20250403173630_748349_0.jpg)
![[NSP PHOTO][들어보니]김병환은 돌아섰다…재등장한 지분형 모기지, 학계·업계 우려](https://file.nspna.com/news/2025/03/27/20250327113655_746848_0.jpg)
![[NSP PHOTO][들어보니]혜택구성·멤버십관리 신세계 최하위…만족도, 소비자 판단](https://file.nspna.com/news/2025/03/13/20250313090929_744276_0.jpg)
![[NSP PHOTO][들어보니]소비자 우려 불구 농심 라면·스낵 7.2%↑…경영여건 악화](https://file.nspna.com/news/2025/03/06/20250306171604_743300_0.jpg)
![종근당[N06] [NSPAD]종근당](https://file.nspna.com/ad/N06_jonggdang_4522.png)
![롯데건설[N06][N06_lottecon_4521] [NSPAD]롯데건설](https://file.nspna.com/ad/N06_lottecon_4521.jpg)
![하나금융[N06] [NSPAD]하나금융](https://file.nspna.com/ad/N06_hanagroup_4520.jpg)
![스마일게이트[N06] [NSPAD]스마일게이트](https://file.nspna.com/ad/N06_smilegate_4503.jpg)
![동아제약[N06] [NSPAD]동아제약](https://file.nspna.com/ad/N06_doasosio_4502.jpg)
![LG유플러스[N06] [NSPAD]LG유플러스](https://file.nspna.com/ad/N06_uplus_4501.jpg)
![우리은행[N06] [NSPAD]우리은행](https://file.nspna.com/ad/N06_wooribank_4493.jpg)
![한국콜마[N06] [NSPAD]한국콜마](https://file.nspna.com/ad/N06_kolma_4492.jpg)
![OK저축은행[N06][N06_oksaving_4480] [NSPAD]OK저축은행](https://file.nspna.com/ad/N06_oksaving_4480.png)
![넷마블[N06] [NSPAD]넷마블](https://file.nspna.com/ad/N06_netmable_4477.jpg)
![우리카드[N06] [NSPAD]우리카드](https://file.nspna.com/ad/N06_wooricard_4470.png)
![신한카드[N06] [NSPAD]신한카드](https://file.nspna.com/ad/N06_shinhancard_4468.jpg)
![KB국민은행[N06] [NSPAD]KB국민은행](https://file.nspna.com/ad/N06_kbstar_4445.jpg)
![[NSP PHOTO][식품업계 기상도]SPC삼립 맑음·비알코리아 흐림](https://file.nspna.com/news/2025/03/28/20250328184311_747301_0.jpg)
![[NSP PHOTO][금융업계기상도]KB국민은행 맑음·IBK기업은행 비](https://file.nspna.com/news/2025/03/28/20250328164047_747255_0.jpg)
![[NSP PHOTO][식품업계 기상도]빙그레 맑음·롯데칠성 흐림](https://file.nspna.com/news/2025/03/21/20250321181558_746005_0.png)
![[NSP PHOTO]5년간 부동산대출 506조 증가…GDP 대비 가계대출 90.7%](https://file.nspna.com/news/2025/04/03/photo_20250403152146_748282_0.jpg)
![[NSP PHOTO]미 관세폭탄에 최상목 시장 변동성 과도한 확대 시 시장안정조치 즉각 시행](https://file.nspna.com/news/2025/04/03/photo_20250403094946_748115_0.jpg)
![[NSP PHOTO]신세계·롯데 아픈손가락, 편의점·이커머스…동종업계 꼴찌행](https://file.nspna.com/news/2025/04/02/photo_20250402154856_748029_0.jpg)
![[NSP PHOTO]LG전자·기아 맞손…AI 모빌리티 공간 솔루션의 새 패러다임 제시](https://file.nspna.com/news/2025/04/03/photo_20250403141844_748258_0.jpg)
![[NSP PHOTO]새마을금고, 24개 금고 합병…고객출자금·예적금 전액 보호](https://file.nspna.com/news/2025/04/03/photo_20250403101710_748123_0.jpg)
![[NSP PHOTO]유상대 한은 부총재 미 상호관세, 예상보다 강한 수준](https://file.nspna.com/news/2025/04/03/photo_20250403100727_748119_0.jpg)
![[NSP PHOTO]삼성전자 DX부문장 노태문 사장 선임…한종희 부회장 공백 최소화](https://file.nspna.com/news/2025/04/01/photo_20250401161601_747754_0.jpg)
![[NSP PHOTO]하이브IM, 300억원 추가 투자 유치…게임 사업 가속화](https://file.nspna.com/news/2025/04/01/photo_20250401112032_747601_0.jpg)
![[NSP PHOTO]금융당국 수장들, 지분형 모기지 전환 한목소리](https://file.nspna.com/news/2025/04/03/photo_20250403173630_748349_0.jpg)
![[NSP PHOTO]데브시스터즈, 쿠키런: 모험의 탑 日 정식 출시](https://file.nspna.com/news/2025/04/03/photo_20250403141621_748257_0.jpg)
![[NSP PHOTO]SKT·케플러 맞손…AI 기반 시장 정보 분석 협력](https://file.nspna.com/news/2025/04/03/photo_20250403140752_748247_0.jpg)
![[NSP PHOTO]삼성물산, 유럽 원전 시장 공략 가속화](https://file.nspna.com/news/2025/04/02/photo_20250402164002_748059_0.jpg)
![[NSP PHOTO][타보니]KGM 토레스 하이브리드, 연비·가격·성능 다잡은 SUV](https://file.nspna.com/news/2025/03/27/20250327134833_746895_0.jpg)
![[NSP PHOTO][타보니]렉서스 LX 700h, 오프로드를 즐기는 회장님의 품격](https://file.nspna.com/news/2025/03/24/20250325174223_746095_0.jpg)
![[NSP PHOTO][타보니]지프 최초 전기 SUV 어벤저, 유럽서 10만 건 계약 이유는](https://file.nspna.com/news/2025/03/21/20250321152243_745922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