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에세이 ‘그리운 시절’ 연재, ‘후미코(文子) 이모 시집 가던 날’ (12)
당사는 저자의 허락을 얻어 ‘그리운 시절 마이 러브 마이 라이프’를 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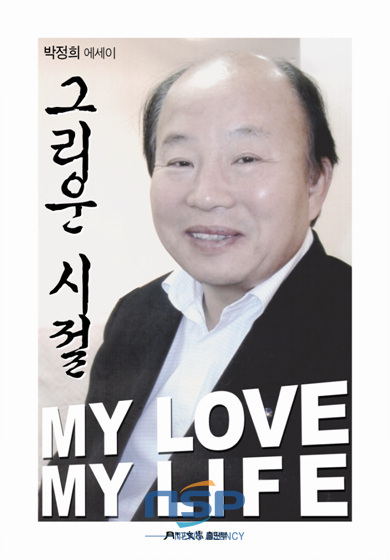
(부산=NSP통신 허아영 기자) = [편집자 주] 월간문학(月刊文學)이 全日신문 동경특파원을 지낸 시인이자 수필가 월포(月浦) 박정희 선생의 인생 스토리를 담은 에세이 ‘그리운 시절 마이 러브 마이 라이프’를 발간했다.
박 선생은 이 책 속에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얽힌 그의 가족사를 통해 두 나라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지내왔다는 것을 작게나마 알리려는 노력을 담았다.
당사는 비록 작은 개인사, 가족사에 불과할지라도 결국 작은 가족사들이 모여 한 나라의 흐름이 결정되지는 않을까 하는 저자의 마음을 담아 이를 연재한다.
[후미코(文子) 이모 시집 가던 날 (후편)]
24살, 당시만 해도 혼기를 훨씬 넘긴 나이였던 이모에게 중매가 들어왔던 것이다. 상대는 이모보다 7살 많은 어부였다. 뒤에 안 것이지만 성정도 몹시 거칠었다. 누구보다 마음씨 곱고 살림 잘 하는 이모였지만 전쟁통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터라 좋은 혼처가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나를 돌보고 살림을 챙기느라 혼기도 놓쳐 버렸다. 이모가 시집 간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모가 내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다. 이대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을 줄만 알았던 것이다.
어머니를 대신해 정을 주고받았던 이모가 집을 떠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나의 애타는 마음과는 상관 없이, 이모의 혼례날은 자꾸만 다가왔다. 외할머니와 이모는 밤새 호롱불을 밝히고 혼수를 짓기 시작하셨다. 고운 색의 천을 끊어 이모가 입을 치마저고리며 시부모님께 드릴 옷을 손수 만들었다. 그 모습을 보니 이모가 정말로 시집을 간다는 것이 실감나 견딜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옷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놓고도 싶었으나, 마음 뿐 차마 그러지는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이모가 시집가기 전 마지막 밤, 나와 이모는 이불 속에서 부둥켜안고 엉엉 울었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키워 온 이모도, 이모를 어머니처럼 따랐던 나도, 서로가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온다는 것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었다. 우리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동네 아낙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혼례를 올리는 날이면 온 동네가 잔칫날이 되던 때였다. 아낙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준비를 시작했고, 남자들은 대례청을 세우는 일에 매달렸다. 마당에는 금세 대례상(大禮床)이 차려졌다. 사철나무와 밤, 대추, 쌀이 올랐다. 사철나무는 절개를, 밤과 대추는 장수와 다남(多男)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례상에 빠지지 않는 것들이었다.
신랑신부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청실과 홍실도 올랐다. 청홍색 보자기에 싼 닭 한 쌍도 남북으로 놓였다. 혼례식을 준비하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흥분으로 들떠 있었지만 이모를 떠나보내야 하는 나는 조금도 즐겁지가 않았다. 이모 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고운 활옷을 입고 족두리를 쓴 채 연지곤지를 찍고 앉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인 듯 예뻤지만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나의 마음도 이모와 다르지 않았다.
마침내 사모를 쓰고 푸른 단령포를 입은 신랑이 조랑말을 타고 도착하자, 혼례식이 시작되었다. 각각 대례상의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선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절을 한 뒤 술을 나누어 마시는 것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
"신부가 참 곱네, 고와!"
"혼례날에 신부가 웃으면 딸 낳는 법이야. 조금만 웃어야 아들도 낳고 딸도 낳지!"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은 이모가 수줍게 술을 받아 마실 때 덕담을 하거나 당부의 말을 던졌다. 이모가 예쁜 것은 사실이었지만 나는 그 말이 반갑지 않았다. 이모가 내게서 자꾸만 멀어지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조상님, 하객들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 혼례식이 끝나자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졌다. 음식과 술이 푸짐히 차려진 상이 연이어 나오기 시작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 남자들은 얼굴이 붉어지도록 술을 마셨다. 마을 사람들은 막내딸을 시집보내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 연신 축하의 말을 건넸다. 외할아버지는 함박웃음을 지으시며 인사를 받으셨지만, 외할머니는 기쁜 한 편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셨다. 큰딸이 일본으로 떠난 뒤, 의지했던 막내딸마저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 못내 슬펐던 것이리라. 외할머니의 그 마음을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잔치 때만은 잠시 슬픔을 잊은 채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평소에는 쉽게 먹을 수 없었던 음식들이 가득했다. 기름기 흐르는 고기며 커다란 생선, 온갖 나물에 색색의 유과도 먹을 수 있었다. 나는 고소한 콩고물을 묻힌 인절미를 잔뜩 가져다가, 친구들과 병풍 뒤에 숨어 달콤한 조청에 찍어 먹으며 좋아했다.
그러나 막상 이모가 신랑을 따라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들떴던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이 몰려 왔다. 나는 이모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서럽게 울었다. 이모도 나를 부둥켜안고 울었다. 나는 이모를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억지로 떼어놓고는 이모를 가마에 오르게 했다. 청색과 홍색, 노란색과 초록색의 술이 달리고 화려한 꽃무늬가 그려진 꽃가마였다. 고운 옷에 고운 가마. 넉넉지 않았던 살림에 이모가 처음으로 누리는 호사였지만 슬픔에 겨운 이모는 그런 것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문이 내려지고, 시댁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마를 들어 마을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눈물 콧물을 흠뻑 흘리며 가마를 따라갔다. 이모도 작은 창문을 열고 자꾸만 나를 뒤돌아보며 눈물을 흘렸다.
추수가 끝나고 텅 빈 들녘 길에는 이모를 배웅하는 동네 사람들로 가득 찼다. 나는 물론이요, 이모의 친구들도 가마 뒤를 따라가며 손을 흔들고 눈물을 훔쳤다. 한 번 혼례를 올리고 집을 떠나면 남남이 되어 버리던 시절이었다. 아무리 가까운 곳에 산다 해도 친정을 방문하는 것이 웬만해서는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움을 안은 채 서로 마음 속으로만 생각해야 했다. 어린 나이에도 이를 잘 알았던 나는 이모를 부르며 꽃가마가 동구 밖을 벗어날 때까지 따라갔다. 온 길이 눈물 바다였다.
그렇게 이모가 시집을 가 버리고 나자, 며칠 동안 나는 집에 돌아오기가 싫었다. 행여나 나를 부르는 이모의 목소리가 들려올까 싶어 늦게까지 친구들과 놀아도 보았지만, 소용 없는 일이었다. 이모는 이제 더는 우리 가족이 아니었다. 친구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마지막까지 혼자 남아 있던 나는 겨우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다 이모가 떠나간 동네 어귀에 다다를 때면 나도 모르게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서럽게 울며 이모를 불렀다. 당장이라도 이모가 달려 나와 치마폭으로 내 얼굴을 닦아 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시집 간 이모에게선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목이 터져라 부르던 내가 안쓰러웠는지, 곁을 지나던 동네 아저씨가 내 손을 잡아 집으로 데려다 준 일도 있었다. 나를 기다리던 할머니가 이모 대신 얼굴을 씻기고 치마로 닦아 주셨다. 그리고 이모 없이 세 식구가 둘러 앉아 말없이 저녁을 먹었다. 할머니는 이모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셨다. 그 한숨소리는 한겨울 차디찬 바람처럼 내 마음을 아리게 했다.
그렇게 나는 어머니에 이어 정 들었던 후미 이모와도 긴긴 이별을 맞았다.
nsplove@nspna.com, 허아영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4125.gif)
![[NSP7컷]인터넷은행의 혁신적인 배신 [NSP7컷]인터넷은행의 혁신적인 배신](https://file.nspna.com/news/2023/05/30/photo_20230530123951_639759_0.jpg)
![[NSP PHOTO][업앤다운]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https://file.nspna.com/news/2024/11/22/20241122172247_728271_0.jpg)
![[NSP PHOTO][업앤다운]은행주 상승…하나금융↑·제주은행↓](https://file.nspna.com/news/2024/11/22/20241122163843_728238_0.jpg)
![[NSP PHOTO][업앤다운]건설주 상승…두산에너빌리티↑·코오롱글로벌↓](https://file.nspna.com/news/2024/11/22/20241122165108_728228_0.png)
![[NSP PHOTO][들어보니]해외수주 1, 2위 다툰 삼성물산·현대건설 뒷걸음질..대내외적 원인](https://file.nspna.com/news/2024/11/05/20241105174215_725327_0.png)
![[NSP PHOTO][들어보니]인터넷은행 등 가상계좌 악용 청소년 범죄↑…은행권 작정하고 속이면 심사통과](https://file.nspna.com/news/2024/03/18/20240318130327_688317_0.jpg)
![[NSP PHOTO][들어보니]홍콩ELS 0~100% 배상안에 은행권 차라리 신속히 이사회 설득해야](https://file.nspna.com/news/2024/03/11/20240311140210_687034_0.jpg)
![농협은행[N06] [NSPAD]농협은행](https://file.nspna.com/ad/N06_nhbank_4306.jpg)
![KB국민카드[N06] [NSPAD]KB국민카드](https://file.nspna.com/ad/N06_KBCARD_4299.jpg)
![토스[N06] [NSPAD]토스](https://file.nspna.com/ad/N06_toss_4292.png)
![KB금융지주[N06] [NSPAD]KB금융지주](https://file.nspna.com/ad/N06_kbjiju_4291.gif)
![종근당[N06][N06_jonggdang_4289] [NSPAD]종근당](https://file.nspna.com/ad/N06_jonggdang_4289.png)
![스마일게이트[N06][N06_smilegate_4287] [NSPAD]스마일게이트](https://file.nspna.com/ad/N06_smilegate_4287.jpg)
![기업은행[N06] [NSPAD]기업은행](https://file.nspna.com/ad/N06_IBKBANK_4285.png)
![하나금융[N06] [NSPAD]하나금융](https://file.nspna.com/ad/N06_hanagroup_4283.jpg)
![한진[N06] [NSPAD]한진](https://file.nspna.com/ad/N06_hanjin_4282.png)
![국민은행[N06] [NSPAD]국민은행](https://file.nspna.com/ad/N06_kbstar_4280.jpg)
![영풍[N06][N06_ypung_4279] [NSPAD]영풍](https://file.nspna.com/ad/N06_ypung_4279.png)
![HD현대[N06][N06_HDHKCHUSUN_4278] [NSPAD]HD현대](https://file.nspna.com/ad/N06_HDHKCHUSUN_4278.jpg)
![삼성SDI[N06] [NSPAD]삼성SDI](https://file.nspna.com/ad/N06_samsungsdi_4277.png)
![CJ올리브영[N06][N06_CJGROUP_4276] [NSPAD]CJ올리브영](https://file.nspna.com/ad/N06_CJGROUP_4276.png)
![위메이드[N06][N06_wemade_4269] [NSPAD]위메이드](https://file.nspna.com/ad/N06_wemade_4269.jpg)
![[NSP PHOTO][금융업계기상도]신한은행 맑음·NH농협은행 흐림](https://file.nspna.com/news/2024/11/22/20241122160608_728217_0.jpg)
![[NSP PHOTO][금융업계기상도]카카오뱅크 맑음·케이뱅크 구름조금](https://file.nspna.com/news/2024/11/15/20241115153449_727092_0.jpg)
![[NSP PHOTO][금융업계기상도]우리은행 비온뒤갬·케이뱅크 흐림](https://file.nspna.com/news/2024/11/08/20241108174637_725979_0.jpg)
![[NSP PHOTO]대출 한파에 은행앱 사실상 개점휴업…카드론 급전 창구 역할 심각](https://file.nspna.com/news/2024/11/21/photo_20241121121742_727902_0.jpg)
![[NSP PHOTO]부당대출 조병규 우리은행장 피의자 전환…기소 여부 촉각](https://file.nspna.com/news/2024/11/19/photo_20241119151835_727503_0.jpg)
![[NSP PHOTO]은행 가계대출 1000조원 코앞…GDP대비 91.1%](https://file.nspna.com/news/2024/11/19/photo_20241119103149_727414_0.jpg)
![[NSP PHOTO]한남4구역 경쟁력…삼성물산 희소성, 현대건설 대단지 구축](https://file.nspna.com/news/2024/11/22/photo_20241122163616_728201_0.png)
![[NSP PHOTO]DL, 캐나다 비료공장 프로젝트 계약 기대…약 486억 규모](https://file.nspna.com/news/2024/11/21/photo_20241121104306_727858_0.jpg)
![[NSP PHOTO]은행 3분기 누적 이자이익 44조 4000억원](https://file.nspna.com/news/2024/11/19/photo_20241119100444_727408_0.jpg)
![[NSP PHOTO]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 사업 기대 실적 위협 요소](https://file.nspna.com/news/2024/11/14/photo_20241114095428_726731_0.jpg)
![[NSP PHOTO]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는 부당…K-GAMES, WHO-FIC 의견서 제출](https://file.nspna.com/news/2024/11/12/photo_20241112181617_726477_0.jpg)
![[NSP PHOTO]비상 걸린 비상금대출…20대, 중·저신용자 몰려 연체율↑](https://file.nspna.com/news/2024/11/20/photo_20241120150609_727701_0.jpg)
![[NSP PHOTO]우정사업본부 우체국쇼핑, 플래티어 그루비 도입](https://file.nspna.com/news/2024/11/19/photo_20241119102559_727411_0.jpg)
![[NSP PHOTO]시프트업 3Q 영업이익 356억원 기록…전년比 120.4%↑·전분기比 21%↓](https://file.nspna.com/news/2024/11/18/photo_20241118161021_727322_0.jpg)
![[NSP PHOTO]넷마블 신작 세븐나이츠 리버스 첫 공개…내년 출시 목표](https://file.nspna.com/news/2024/11/16/photo_20241116181341_727183_0.jpg)
![[NSP PHOTO][타보니]혼다 CR-V 하이브리드, 2.0L 직분사 앳킨슨 엔진·E-CVT 변속기 조화로 소음·진동 개선](https://file.nspna.com/news/2024/11/21/20241121160311_727980_0.jpg)
![[NSP PHOTO][타보니]르노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가성비·연비 흠잡을 데 없는 SUV](https://file.nspna.com/news/2024/11/19/20241119163226_727533_0.jpg)
![[NSP PHOTO][타보니]K8 하이브리드, 기아의 새 시작 알리는 정통 세단](https://file.nspna.com/news/2024/11/11/20241111153530_726143_0.jpg)